세종시는 상가 공실률 전국 1위인 도시이다.
특히 정부청사 주변 상가는 내가 보기에도 그 상황이 심각하다. 문제는 내가 5년 전쯤 세종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세종에 와서 몇 개월 살고나서 주변사람에게 농담삼아 세종은 낮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 사람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이다(사실 한 번씩 농담으로 "낮에 개미 XX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최근까지도 그냥 가까운 대전이 쇼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젊은 세대가 많아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고, 아울러 세종시가 평균임금은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었다(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유현준 씨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난 후,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부청사 주변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의 요소에 대해서 아래아 같이 말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걷고 싶은 거리와 성공적인 거리(자동차와 사람을 합친 유동 인구가 많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거리)는 다르다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강남의 테헤란로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는 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반면, 명동 같은 거리는 성공적인 거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걷고 싶은 거리이기도 하다.
성공적이지만 걷고 싶지 않은 거리들은 대부분 휴먼 스케일 수준에서 체험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거리는 대부분 압도적인 스케일로서 상징성을 가지는 거리이다. 걷는다는 행위는 시속 4킬로미터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중략)
보행자가 걸으면서 마주치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날수록 그 도시는 우연성과 이벤트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말은 보행자가 다른 날 다시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다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뜻함과 동시에 하루를 걷더라도 다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뜻함과 동시에 하루를 걷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거리당 출입구의 수는 거리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단위 거리당 출입구 숫자가 많아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를 ‘이벤트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해 보자. 높은 이벤트 밀도의 거리는 보행자에게 변화의 체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5미터에 하나씩 점포의 출입구가 나온다는 것은 보행자의 속도를 시속 4킬로미터로 보았을 때 4.5초당 새로운 점포의 쇼윈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쇼윈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는 신상품 옷일수도 있고 식당에 앉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중략)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는 우연성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걸으면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거리가 더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 세종시의 공실률이 높은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가 건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힘들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가 건물과 주변 거리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일부 상가들이 건물 지하에 있어 걸으면서 볼 수도 없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상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의 필요성'과 '아파트에서 TV의 의미'에 대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한다.
1)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의 필요성
"우리가 건축을 하드웨어로만 보면 그냥 보존에 치중하게 되는 반면, 소프트웨어로 보면 좀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 선진국은 일찍이 건축 문화재를 소프트웨어로 보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잘 보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르세 미술관이다. 이 건물은 원래 파리의 기차역이었다. 당시의 기차는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끌었기 때문에 객차 수가 열개 남짓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엔진의 마력이 높아지게 되고 객차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객차 개수가 늘어나자 기존의 기차역 플랫폼의 길이가 짧아서 늘어난 객차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서 기차역은 폐쇄되었다. 이후 오르세역은 몇 번의 용도 변경을 거쳐서 지금의 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은 시대를 거치면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건축물을 더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이다."
2) 아파트에서 TV의 의미
"우리는 TV를 시청하면서 특별히 볼 채널이 없을 때 2~3초에 한 번씩 채널을 바꾼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특별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서로 다른 채널의 화면 속 영상들이 새로운 시퀀스로 편집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단순하게는 다른 채널로 바뀐다는 변화의 리듬감 때문에도 끊임없이 TV 앞에 앉아 있게 된다. (중략) 우리는 기억 속에 변화가 없는 집에 살기 때문에 더 TV를 바라보는 것이다. 적어도 TV 속에는 드라마 속에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장면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큰 화면의 TV를 사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벽면 크기만 한 TV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보고 나서 문득 '걷고 싶은 도시'와 '말하고 싶은 사람'은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과 후 동료와 저녁식사를 할 때 회사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물론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서로의 힘든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녁에는 편안하게 각자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리고 서로 배웠으면 하는 마음도 크다.
이 책에서 '이벤트가 많은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 말만 하는 사람' 보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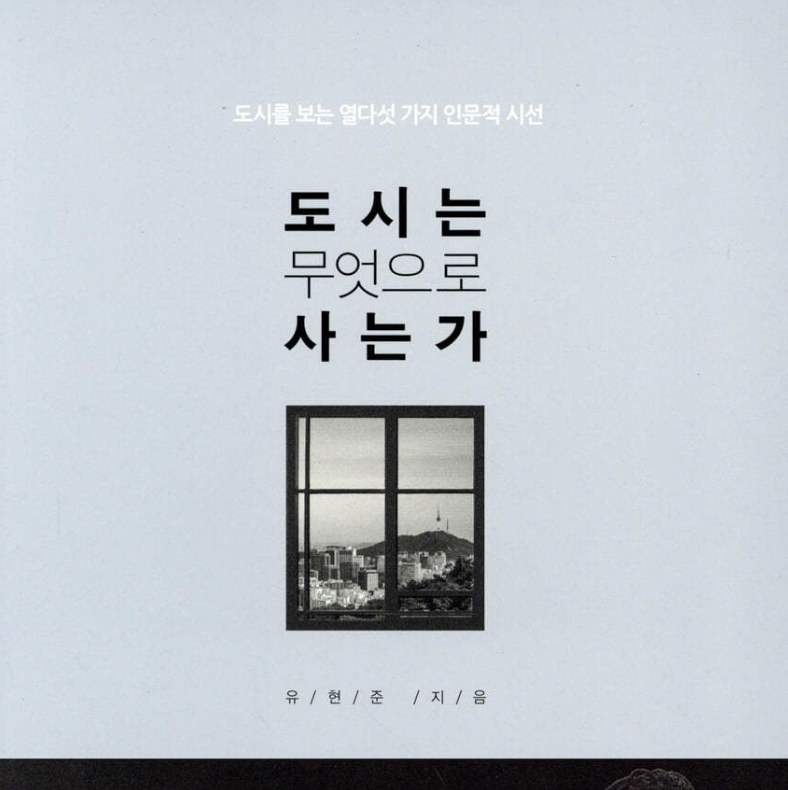
'책, 그리고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0) | 2025.03.16 |
|---|---|
| (김주환: 회복탄력성)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7) | 2025.01.25 |
| (조던 B. 피터슨: 질서 너머) 혼돈의 시기에서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 (5) | 2024.12.14 |
| (보도 섀퍼: 부의 레버리지)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45) | 2024.11.30 |
| (히가시노 게이고: 용의자 X의 헌신) 나 자신을 포기할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7) | 2024.11.17 |



